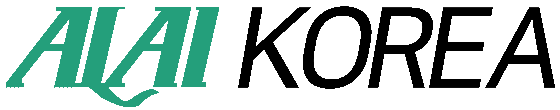제55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7월 16일)
[주제1] “영상저작물 창작자를 위한 보상 제도”(발제자 : 김혜은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주제2] "상업용 음반 전송보상금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발제자 : 성원영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주제1] “영상저작물 창작자를 위한 보상 제도”
발제자 : 김혜은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우리나라 영상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를 규율 하는 법적 제도와 계약 관행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기존 영상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영상산업은 수익 전망의 불확실성, 고용의 불안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창작자들의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 새로운 이용방법 또는 매체의 등장 가능성과 같은 저작권 계약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보상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는 저작권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영상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대표성 있는 영화, 방송영상물, OTT콘텐츠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화와 방송영상물 그리고 OTT콘텐츠는 영상저작물이라는 범주로 묶여있으나, 상이한 제작 과정, 계약 관행, 산업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국내 영상산업의 특성과 저작권 계약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상저작물이 제작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약 관행뿐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에 영상저작물 창작자를 위한 보상 제도를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비례보상 제도와 추가보상청구권 제도로 구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EU DSM 저작권 지침 제18조와 제20조의 조문, 취지, 비판 등을 분석하였다. 두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8조의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은 비례보상 제도의 법리적 근거로, 제20조의 “계약 수정 메커니즘”은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법리적 근거로 차용할 수 있다.
해외 비례보상 제도의 경우 미국의 재상영분배금(Residuals), 프랑스의 저작권법 제131조의 4, 독일 저작권법 제32조 적절한 보상이 있고, 국내 보상 제도의 경우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경우 프랑스 저작권법 제131조의 5, 독일 저작권법 제32a조 저작자의 추가 관여가 있고, 국내 관련 법리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다. 입법 관련 법적 쟁점으로는 헌법적 정당성, 사적 자치의 원칙 제한, 재산권 양도 법리와의 정합성, 준거법으로 인한 국내 영상제작자들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영상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주제2] "상업용 음반 전송보상금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제자 : 성원영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보상청구권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고 준물권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 효력이 없다. 또한 先허락 後사용이 아니라 先사용 後보상의 개념이고, 저작권법 제123조의 침해정지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전제로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020년과 2025년 총 두 차례 방송사업자의 상업용 음반 전송보상금에 대한 저작권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다.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제도의 근거는 로마협약 제12조, WPPT 제15조(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 Right to Remuneratio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가 있다. “음반”의 정의를 살펴보면 로마협약의 경우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를 청각적으로만 고정한 것”을 말한다.(“phonogram” means any exclusively aural fixation of sounds of a performance or of other sounds) WPPT에서는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고정한 것으로서, 영상 저작물이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수록된 형태 이외의 고정물”을 말한다.(“phonogram” means the fixation of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f other sounds, or of a representation of sounds, other than in the form of a fixation incorporated in a cinematographic or other audiovisual work;) 우리 저작권법상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음반이 삽입된 영상물은 음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음반이 삽입된 영상물이 공중전달에 사용된 경우에는 유럽연합 저작인접권지침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보상청구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에서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하고 있으며, 로마협약과 WPPT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보상금 실무는 방송사업자가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하는 방송보상금에 영상물에 포함(싱크)된 실연, 음반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실무 관행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보상금제도의 근거가 되는 WPPT 제15조상 ‘공중전달’에는 전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송보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WPPT 조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고, ‘쌍방향적 송신’에 해당하는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한-미FTA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