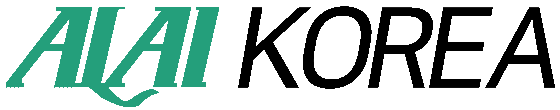제51회 ALAI Korea 월례연구회(2025년 3월 19일)
[주제1] “AI 학습용 자료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F.Supp.3d, Feb 11, 2025) 사건)” (발제자: 강기봉(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주제2] “디지털 모사권 도입을 통한 실연자 권리보호” (발제자: 박유선(강원대학교 데이터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미국 변호사)
[주제1] “AI 학습용 자료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F.Supp.3d, Feb 11, 2025) 사건)” (발제자: 강기봉(서강대학교 대우교수)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와 West Publishing Corp.는 법률 연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AI 기반 법률 연구 경쟁사인 Ross Intelligence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 연구 플랫폼인 Westlaw의 headnotes(법률 판례 요약)와 Key Number System(법률 번호 체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Ross가 이를 무단으로 AI 훈련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Ross의 이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headnotes와 Key Number System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고, Ross가 총 2,243개의 headnotes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Ross는 방어 논리로 ‘innocent infringement’, ‘copyright misuse’, ‘merger doctrine’, ‘scenes à faire’를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공정 이용 논리 또한 Ross의 이용이 상업적이며 변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별 headnotes가 편집적 판단(editorial judgment), 종합(synthesis), 선택(selection)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독창성이 있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비록 일부 headnotes가 판결문을 직접 인용했더라도, 이를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창작적 노력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법률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ey Number System도 충분히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판단했는데, 첫째, Actual Copying(실제적인 복제)에 대해서는 Ross는 Westlaw의 headnotes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AI 훈련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전문가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Substantial Similarity(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Westlaw의 headnotes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 이용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목적과 성격의 경우 Ross의 이용은 상업적이며, Westlaw와 경쟁하는 법률 연구 도구를 생성했기 때문에 변형적이지 않았다고 보았고, 2. 저작물의 성격은 headnotes는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소설이나 예술과 같은 창작과 비교하면 그 정도가 낮다라고 보아 Ross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3.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Ross가 Westlaw의 headnotes를 직접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Ross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4.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Ross의 행위는 법률 연구 도구 시장과 AI 훈련 데이터의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Thomson Reuters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원은 Thomson Reuters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Ross의 공정 이용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AI는 생성형 AI가 아닌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AI이기 때문에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하거나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AI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주제2] “디지털 모사권 도입을 통한 실연자 권리보호” (발제자: 박유선(강원대학교 데이터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2023년 7월, SAG-AFTR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연자의 목소리, 초상, 연기의 디지털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을 단행하였다. 118일간의 파업은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동의권을 영화제작자협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초상, 이미지, 목소리 등을 극히 사실적이며 정교하게 디지털화한 복제물의 생성과 조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인격 표지 주체의 경제적 및 인격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하에서 이를 보호할 장치는 미비하다. 디지털 모사물은 전통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달리 인격 표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능력과 행위를 복제하여 실제 인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연자는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디지털 모사물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인격 표지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인격 표지에 대한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과 사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디지털 모사권에 대한 연방법 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개인에게 음성, 초상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NO FAKES Act(Nurturing Originals, Fostering Artistic Knowledge, and Establishing Safeguards Act)와 미국 연방 상표법에 디지털 모사물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한 PADRA(Preventing Abuse of Digital Replicas Act)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실연자 보호의 필요성은 디지털 모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인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디지털 모사권 도입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권리 침해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실연자의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디지털 모사권 도입 시 법적 성격 명확화, 보호 대상 및 범위, 보호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